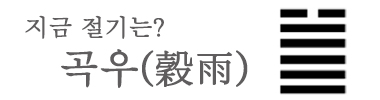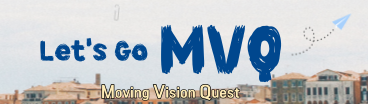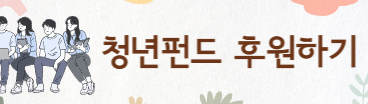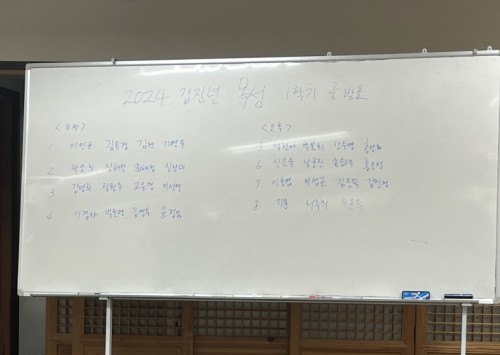<한겨레> 쿠바에는 ‘3분 진료’ 대신 마을진료소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이당 작성일23-07-19 21:29 조회409회 댓글0건본문
‘공공의료의 나라’ 쿠바 의료 소개
가족주치의 있는 마을진료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심장’


쿠바에서 만난 생활의 치유력
김해완 지음 l 북드라망 l 1만8000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줄어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새벽 5시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나라.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중 3명이 ‘n수’를 해
필코 의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만,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나라. 지방에 살면 서울과 달리 응
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 내에 병원에 도달하기 힘든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운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료체계와 의사 양성 과정을 가진 쿠바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이 나왔다.
<쿠바와 의생활>은 쿠바에서 3년 넘게 거주하고 그 가운데 2년은 아바나 의과대학 학생으로 공부한 김해완 작가가 썼다. <다른 십 대의 탄생> 등
4권의 인문학 책을 쓴 작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인문학 공부와 공동체 생활을 하며 10~20대를 보냈다. 이후 남미 문학을 전공하러 2017년 쿠바에 갔다가 쿠바 의료에 반해 의학도가 됐다.
책은 ‘공공의료의 나라’인 쿠바가 어떤 의료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지 생생하게 전한다. 쿠바 의료는
콘술토리오, 폴리클리니코, 오스피탈이라는 세 기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저자는 이 가운데 일차의료기관이면서 동네 사랑방과 같은 구실을 하는 콘술토리오에 주목한다.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콘술토리오에는 가족주
의와 간호사가 상주한다. 낡은 의자와 주치의의 책상이 전부인 이곳에서 평균 500~700가구의 건강을 책임진다.
콘술토리오는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고 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 임무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빨리 진단해서 약이나 주사를 주면 의사의 임무가 끝나는 한국과 달리 콘술토리오의 가족주치의들은 환자의 생활 습관, 집안 사정 등에 훤한 ‘오지랖 대마왕’이다. 주치의와의 검진 약속을 잊어버린 젊은 임신부를 찾기 위해 주치의와 간호사가 그 임신부가 놀러 갔을 법한 동네 친구들 집에 전화까지 돌리는 쿠바 진료소 풍경은 한국의 ‘3분 진료’와 대비돼 생경하게만 다가온다. 입학도 어렵고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한국 의대와 달리 쿠바 의대는 매년 1만명이 넘는 의사를 배출할 정도로 타과에 비해 정원이 많고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도 새롭다. 단, 쿠바 의대는 입학은 쉬워도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쿠바의 의료체계의 근간에 대해 작가는 ‘의(醫)생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일상 관계 속에서 생로병사에 대해 공유하는 모든 것”을 의생활이라고 지칭하면서, 쿠바 의(醫)의 정수는 병에 걸리고 아프더라도 콘술토리오라는 ‘관계망’에서 수다를 떨며 도움의 손길을 주고받는 ‘의생활’에 있다고 말한다.책을 읽고 나면 “빠르게, 값싸게, 편하게 병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의생활’이라는 개념을 통해 병의 치료와 치유에 있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